[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했더라도, 당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하면서도, 비밀준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과거 교제하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촬영해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제3자 B씨에게 유포하고,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 신상 정보도 함께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진 위에 자신의 성기를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 A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A씨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비밀준수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비밀준수 조항을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문언상 해당 조항의 보호 대상은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던 피해자'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해당 조항은 '성폭력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제24조 제1항의 수범자는 '성폭력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수범자가 있을 수 없다"며 "이 조항 보호 대상인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던 피해자임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제2항은 수범자를 '누구든지'라고 확대하면서도 보호 대상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1항에 따른 피해자'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며 "이와 달리 이를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은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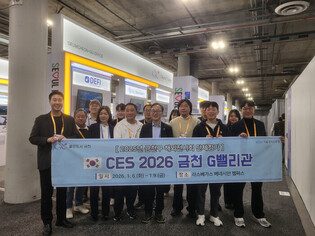






































![[로컬거버넌스]인프라 혁신으로 '체육르네상스' 연다… 인구 유입 늘고 지역상권에 활기](/news/data/20260111/p1160275997812534_367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민·관 협업정책 활발](/news/data/20260108/p1160279048482936_964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해남군, 작년 혁신군정 성과 돋보여](/news/data/20260107/p1160279036637264_50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도시여가 빅데이터’ 적극 활용](/news/data/20260106/p1160278490915305_261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