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지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망한 최고은(32) 감독을 애도하면서 영화산업 시스템과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고인의 죽음 뒤에는 창작자의 재능과 노력을 착취하고, 단지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쓰려하는 잔인한 대중문화산업의 논리가 도사리고 있다”며 “창작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산업 시스템과 함께 정책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화 스태프가 생존을 위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즈음인 2000년도 연평균 소득은 337만원, 10년이 지난 2009년도 연평균 소득은 623만원으로 조사됐다”며 “조금 나아지기는 했으나 월급으로 치면 52만원이 채 되지 않는 액수로 여전히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반복되는 실업기간 동안 실업 부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요구를 수없이 해왔다”며 “만약 실업부조제도가 현실화 돼 고인이 수혜를 받았더라면 작금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명백한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언제나처럼 가야할 길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또다시 슬퍼하고 추모하며 그렇게 잊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인이 남긴 짐이 너무 무거워 지고 가는 다리가 휘청거려도 끝끝내 가슴에 새기며 가야한다. 그것이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영화 스태프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해를 대변해야 할 책무를 진 노동조합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통해했다.
노조는 “고인의 죽음 뒤에는 창작자의 재능과 노력을 착취하고, 단지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쓰려하는 잔인한 대중문화산업의 논리가 도사리고 있다”며 “창작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산업 시스템과 함께 정책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화 스태프가 생존을 위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즈음인 2000년도 연평균 소득은 337만원, 10년이 지난 2009년도 연평균 소득은 623만원으로 조사됐다”며 “조금 나아지기는 했으나 월급으로 치면 52만원이 채 되지 않는 액수로 여전히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반복되는 실업기간 동안 실업 부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요구를 수없이 해왔다”며 “만약 실업부조제도가 현실화 돼 고인이 수혜를 받았더라면 작금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명백한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언제나처럼 가야할 길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또다시 슬퍼하고 추모하며 그렇게 잊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인이 남긴 짐이 너무 무거워 지고 가는 다리가 휘청거려도 끝끝내 가슴에 새기며 가야한다. 그것이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영화 스태프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해를 대변해야 할 책무를 진 노동조합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통해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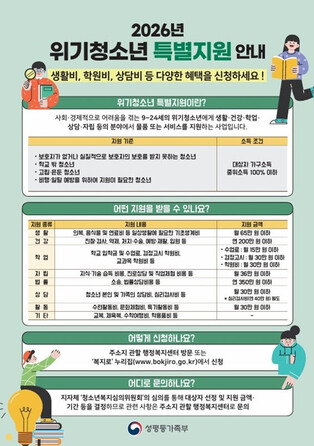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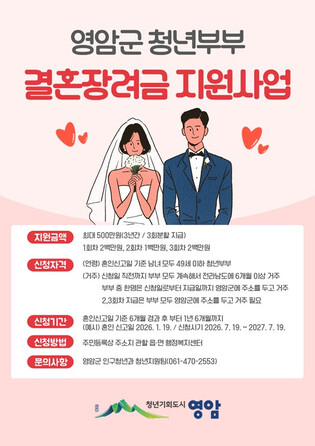
































![[로컬거버넌스]인프라 혁신으로 '체육르네상스' 연다… 인구 유입 늘고 지역상권에 활기](/news/data/20260111/p1160275997812534_367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민·관 협업정책 활발](/news/data/20260108/p1160279048482936_964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해남군, 작년 혁신군정 성과 돋보여](/news/data/20260107/p1160279036637264_50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도시여가 빅데이터’ 적극 활용](/news/data/20260106/p1160278490915305_261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