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한편으로는 단편적인 연설내용 하나 가지고 취임이후 첫 번째 외교 순방길에 오른 현직 대통령을 비난하는 언어폭력이 도를 넘고 있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방미 사흘째인 13일 오전(한국시간) 노대통령은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행사장 연설에서 “53년 전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말 때문에 노대통령은 굴욕적인 방미외교를 보였다며 친미사대니 구걸외교니 하는 온갖 비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평소 성향과는 너무나 다르게 펼쳐진 미국에 대한 노대통령의 ‘립서비스’ 발언은 의외이긴 하다.
그러나 해당 연설문의 행간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통령을 무조건 몰아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연설문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을 불안하게 보는 미국의 시각을 불식시켜야겠다는 대통령의 고군분투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 누구보다 확실한 비전과 신념을 가진 그다.
그는 소신을 위해서라면 불을 지고 화약고에 뛰어드는 무모한 행보도 마다하지 않았던 전력과 함께 자신의 ‘뻣뻣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런 강직함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수많은 개미후원이 모여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냈다.
이번 방미가 대통령이 아닌 개인신분의 일정이었다면 단언컨대 그는 결코 미국을 향한 ‘찬가’를 자신의 입밖에 내지 않았을 것이다.
누군들 남 앞에서 고개 조아리는 일을 좋아하겠는가.
그가 방미길에 오르기 전 솔직히 많은 사람들은 노대통령의 유연하지 못한 ‘솔직함’을 걱정했었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은 한미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나 않을까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국익을 앞세운 실리적 외교를 펼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한반도 안보의 선결조건인 한미동맹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는 지금 최악의 조건아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국의 대통령 신분으로 그가 자신은 물론 국가의 자존심까지 내팽개치고 미국에 아부성 발언을 할 수 밖에 없는 그의 처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온다.
백척간두에 서있는 한반도의 위기상황 앞에서 그는 오로지 절박함에 빠진 가난한 아버지였을 뿐이다.
국가와 민족의 안위와 장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 우리가 노대통령에 쥐어준 카드는 오로지 ‘자기희생’ 하나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희생하는 아버지의 노고를 위로하기는커녕 상처를 헤집고 있는 꼴 아닌가.
지금은 그를 흔들 때가 아니다.
온 국민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의 의지와 판단을 믿고 지켜보아야 할 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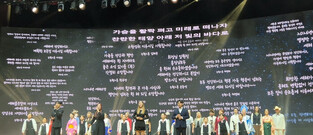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민·관 협업정책 활발](/news/data/20260108/p1160279048482936_964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해남군, 작년 혁신군정 성과 돋보여](/news/data/20260107/p1160279036637264_50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도시여가 빅데이터’ 적극 활용](/news/data/20260106/p1160278490915305_261_h2.pn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아이스월드 빙파니아’ 개장](/news/data/20260105/p1160279068418260_51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