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수집 소장품 100여점 한자리에
'물질' 작업복·도구등 통해 옛 해남·해녀 이야기 조명
문화·지역적 특성 담긴 병풍·바둑판·안경집등 유물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역사박물관이 1층 로비에서 오는 7월30일까지 ‘바당수업水業’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서울시-제주도 교류 강화 업무 협약’에 따른 것으로, 사시사철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경관의 제주 이면(裏面)의 모습인 생업을 위한 현장으로서의 제주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38년간 수집해 온 소장품 중 100여점을 통해 보여준다.
특히 다양한 어구를 비롯해 바다와 관련된 제주 민속 예술품까지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용석 관장은 “‘바당수업水業’ 전시는 서울시민들에게 제주 고유의 민속자료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제주도의 이야기와 민속문화를 서울시민들께 소개할 기회를 갖는 동행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여름박물관에서 푸른 바다, 때로는 거칠었던 바다와 공존해야 했던 ‘제주 어머니’들을 만나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바당 밖 물
도입부는 제주의 지형과 토양을 다루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육지에서 볼 수 없는 제주 특유의 농기구인 ‘남테’ 실물을 전시, 제주 지형과 현무암질 토양 관련된 농업 활동을 다룬다.
남테는 제주도의 대표 농법인 밧볼림(밟기)에 쓰이는 것으로 씨앗 파종 뒤 땅을 단단히 밟아줘 가뭄 피해를 줄여준다.
■ 바당 위 아방
다음으로 ‘여다女多의 섬’으로 알려진 제주에 배를 부리고 고기를 잡았던 ‘포작인’이라 불렸던 제주 해남에 대해 조명했다.
육지의 남아선호와는 반대로, 제주에서는 옛날부터 나라에 바칠 공물을 마련하러 배를 타고 위험한 먼 바다에 나가야만 했던, 그래서 ‘고래의 먹이가 될지도 모를’ 아들보다 딸을 선호했다.
이로 인해 남성 인구가 점차 줄어들자 출륙금지령까지 내려지게 된 이야기를 담아낸다.
■ 바당 아래 어멍
‘제주 사람’하면 바다와 공존하는 삶을 살았던 어멍(어머니)을 떠올리기 쉽다. 조선 후기까지도 알몸으로 물질(바닷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하던 해녀들은 제주를 지키고 지금의 제주를 만든 해양전문가다.
이들의 전통 작업복인 ‘물적삼’, ‘물소중이’와 기량이 뛰어난 상군해녀가 사용했던 ‘소살’도 전시해 눈길을 끈다.
■ 바당의 신
제주도에는 ‘당堂 오백 절 오백’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거칠고 험난한 바다에서 가족이나 마을사람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신神을 모시는 제祭 문화로 자연스럽게 발달한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연출을 통해 무구류를 포함한 ‘잠수굿’ 상차림과 배방선을 재현하여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 바당을 담다
마지막으로는 제주섬과 제주 풍경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제주에서 병풍은 의례용이나 관상용보다는 바람막이용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이번에 전시되는 ‘효제문자도’는 식생과 제기, 사당 등을 그려 넣어 장식성이 강조되어 있다.
이는 제주에 도입, 정착하면서 원래의 내용과 형식에서 벗어난 형태이다. 이외에도 십장생 중 하나인 거북을 모양으로 한 목재 바둑판, 물고기 모양 백자 청화 연적, 어피안경집 등도 전시될 예정이다.
■ 남방큰돌고래
제주 근해에 서식하는 다양한 포유류 중에서 남방큰돌고래는 2012년 서울시에서 서울대공원 돌고래쇼 중단 결정을 내리자 자연 방사하면서 관심을 받아왔다. 작년 ‘비봉이’를 적응 훈련시키고 방류함에 따라 8마리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과정을 담은 영상도 소개하는데 관람객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해줄 것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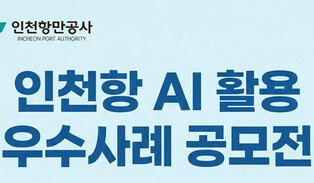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혁신군정' 성과](/news/data/20251225/p1160285318798120_814_h2.jpg)
![[로컬거버넌스]인천관광공사, 연말연시 인천 겨울 명소 추천···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news/data/20251224/p1160266097659898_23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성공버스’ 전국 확산](/news/data/20251223/p1160278654727371_70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치매관리사업 ‘경남도지사 표창’](/news/data/20251222/p1160278600517158_36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