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남영진 한국감사협회 고문 | ||
몇 년전 KBS의 특집 다큐멘타리 ‘차마고도’가 인기리에 방영됐다. 중국 운남성에서 4천-5천미터 고지의 히말라야산맥을 넘어 티벳과 네팔 인도등지로 중국산 차와 소금을 가져가 현지서 곡물, 옥등 보석, 동물가죽과 털등과 물물 교환하는 ‘죽음의 캐러번’(隊商)의 눈물겨운 삶의 여정을 그린 다큐였다.
MBC의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북극의 눈물’등 눈물시리즈와 맞먹는 호평을 받았다.
근데 워낙 영상미와 취재노력이 돋보여 제목 ‘차마고도’에 대해 신경을 쓴 사람이 없었다. 제목 ‘차마고도’는 우리발음으로는 ‘다마고도’가 맞다. 녹차, 엽차, 우롱차하는 한자 다(茶)는 ‘다로 쓰고 차로 읽는다’. ‘다방’(茶房)과 차를 마시다의 ‘끽다’(喫茶), 차를 마시고 밥을 먹듯이 늘 일상에서 행한다는 다반사(茶飯事)등은 다라고 읽으면서 왜 녹차(綠茶)나 차례(茶禮)는 차라고 읽을까? 물론 차례는 다례로도 읽는다. 우리는 되도록 한자 한자에 한가지 음으로 읽는 것이 관례여서 당나라이전 일찍 들어온 발음인 다가 더 많이 쓰였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중국이 원산인 차가 원래는 다에 가까운 발음이었던 것 같다. 아직도 남쪽인 광동어에서는 ‘차이’에 가깝게 읽고 복건성, 하문등 중부이상에서는 테나 타이에 가깝게 읽는다. 일찍 유럽에 전해진 영어의 TEA는 차보다는 다에 가까운 발음이다. 실론티나 홍차인 영국의 립튼티, 얼그레이티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태국등에서는 ‘짜이’나 ‘차이’에 가까운 발음이고 일본 페르시아 터키등도 차에 가깝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늦게 전해져 차에 더 가깝다. 다방의 일본어인 끽다점(喫茶店)도 ‘깃사뗀’으로 읽으니 말이다.
우리나라 전래설도 여러 가지다. 중국의 모든 지방에서 차를 마셨으니 우리나라에도 일찍부터 들어왔을 것 같은데 공식기록은 통일신라 흥덕왕때인 828년 김대렴이 중국에서 들여와 지리산록에 심었다는 기록이다. 지금도 하동 화개장터에서 지리산쪽인 쌍계사계곡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차시배지’라고 크게 쓰여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적어도 그보다 400년전인 4세기말로 주장하고 있다.
고구려에 불교가 들어오고 곧이어 중국 남조의 동진에서 마라난타가 백제에 공식포교할 때인 384년 함평의 불갑사에 차나무를 심었다는 것이다. 이지역의 불갑산(佛甲山)이 이미 불교가 처음 전래됐다는 의미이고 굴비조기로 유명한 영광(靈光)이나 그 포구인 법성(法城浦)등이 다 불교와 연관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차례를 지냈던 최초의 불교 전래지역이 차를 시배한 지역이 아닐까 생각도 해본다. 인도로부터 배로 왔다면 소승불교의 경유지였을 탐라 한라 백록담등도 불교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같은 차나무인데 왜 이리 말도 맛도 다를까?
동양3국에서 우리는 왜 중국, 일본인보다 차를 덜마실까?
“차를 중국인은 향으로 , 일본인은 색으로, 한국인은 맛으로 마신다”는 말이 있다. 중국에서는 차에 자스민꽃을 넣어 자스민차를 만들고 보이차, 우롱차등은 발효해서 마신다. 향기가 진하고 화려해도 별로 역하지는 않다.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으려면 강한 발효차가 소화에 좋을 거다. 기름에 볶든지(짜장) 기름에 튀긴(탕수육) 음식을 많이 먹는 중국인들이 비만증니나 성인병에 별로 걸리지 않는 이유가 차를 상음하기 때문이라는 통설이다.
중국의 중심지역이었던 황하주변이나 신개발지인 양자강의 강남이나 지표수는 별로 좋지않다. 황하유역은 이름과 같이 황토 먼지 때문에 누렇고 자주 가물어 하류지역인 산동지방에 짜장면이 생겼다고 한다. 양자강 이남은 비가 많아 산지 아니고는 맑은 샘물을 구경하기 힘들다. 그래서 물을 끓여 먹어야 되고 여기에 비타민 보물인 차잎이 필요했다. 일본도 화산재 토질이어서 비온후의 부연 지표수를 그냥 마시기엔 부적절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화강암에서 솟아오르는 옹달샘물이면 음용수로는 그만이었다. 요즘말로는 우물물이 곧 ‘생수‘(生水)다. 살아있는 물이다. 밥을 한뒤 누룽지 솥에다 부뚜막 옹기의 생수만 부우면 훌륭한 숭늉이 된다. 먹는 음식도 거의 김치 된장 등 식물성이어서 차같은 별스런 소화제가 필요 없다. 고려시대까지 유행했던 차가 더 이상 서민들에게까지 내려가지 않은 이유다. 숭유억불의 조선시대 정책도 한몫해 차가 절이나 암자등서만 마시는 기호품이 됐다. 서민들은 한 뼘 밭뙈기에도 옥수수 감자 고구마 메밀 등 곡물을 심어야 허기와 기아를 면하기 때문에 차는 여유 있는 귀족들이나 선비들이나 즐길 수 밖에. 정약용이 유배생활을 했던 강진의 다산초당과 해남 윤선도와 윤두수의 녹우당을 들르면서 느낀 감회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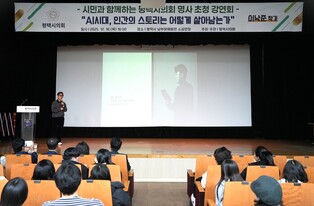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구민들이 뽑은 올해의 뉴스’ 발표](/news/data/20251218/p1160279250720596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올해 새빛 시리즈 정채 값진 결실](/news/data/20251217/p1160278686333473_93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216/p1160278005711962_38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英 런던 도시재생정책 벤치마킹](/news/data/20251215/p1160278249427463_89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