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 ||
저자는 처칠과 오웰이 문명의 존속을 위협하는 종말론적 위기를 만났을 때 우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나서 그 사실에 입각한 신념에 따라 행동하였다.
다른 이들은 악이 승리할 것으로 믿고 그 악과 타협하려 하였다. 두 사람은 용기와 통찰력으로 대응하였다. 저자는 전기의 결론 부분에서 두 사람의 생애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이 점에 두었다. 위기가 닥치면 먼저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신념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이다.
<열심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라.>
때로는 두 사람이 오판을 하곤 하였지만 그런 때에도 사실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오웰은 자신의 생각에 사실을 맞추지 않고 사실이 그의 생각을 바꾸도록 하였다. 그는 사실이 신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다. 사회주의자로서 스페인 내전에 좌파 편을 들어 참전하였지만 거기서 소련 공산주의자들의 실상을 알게 되자 공산주의를 비판하기 시작한다. 이 때문에 극좌, 극우세력으로부터 협공을 당하고 소외되기도 하였다. 그는 불후의 명작 ‘1984’에서 사실을 수집하는 행동은 혁명적 행동이라고 표현하였다. ‘거짓이 판 치는 세상에선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혁명’이라는 것이다.
그의 생애, 특히 ‘1984’의 주제는 거짓선동이 판을 치고 전체주의 독재자들이 표현을 억압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사실을 지켜냄으로써 개인의 존엄성을 지켜낼 것인가였다. 그는 이 소설에서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썼다.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개인의 자유도 지켜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빅 브라더’라는 독재자가 다스리는 ‘1984’의 오세아니아에선 사람들의 기억을 말살하고 조작하기 위하여 과거를 지우거나 왜곡하고, 용어 혼란 전술을 쓰는 시스템이 작동한다. 나치즘이든 공산주의이든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전체주의 체제의 가장 유효한 무기는 거짓말, 그리고 사실의 말살임을 오웰처럼 강조한 문학인은 없었다.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 체제에서 짓눌렸던 지식인들이 오웰을 등대처럼 여겼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84’의 거의 완벽한 재현인 북한은 물론이고, 민주 민족 민중으로 위장한 선동 세력이 국민들을 속여 다방면에서 주도권을 잡고 정권까지 장악한 한국에서도 오웰의 역할은 남아 있을 것이다.
처칠과 오웰은 개인의 존엄성을 전체주의 독재로부터 지켜내는 것을 자신들의 의무, 그리고 문명 보존의 핵심이라고 믿었다. 그런 점에서 스탈린과 히틀러는 각각 좌와 우의 극단에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전체주의 세력이었다.
저자 토마스 E.릭스는 종군기자 출신인데 처칠과 오웰도 종군 기자 출신이다. 처칠은 보어 전쟁에, 오웰은 스페인 내전에 참전, 기록을 남겼다. 오웰은 ‘동물농장’과 ‘1984’으로 유명하지만 스페인 내전 참전기인 ‘카타루니아 송가’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넌픽션으로 꼽힌다. 처칠과 오웰의 사실 우선주의는 당대의 사조나 여론과 맞지 않아 비난을 많이 받았다. 처칠이 예언한 대로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그는 독불장군형 정치인으로 끝났을 것이다. 오웰은 살아 있을 때는 별로 알아주지 않았지만 사후 냉전 시절에 큰 영향력을 끼쳐 20세기를 대표하는 부동의 문학가로 평가 받게 이르렀다. 역사적 대사건들이 두 사람의 지혜로움을 드러내어준 덕분이다.
저자는 ‘처칠과 오웰: 자유를 위한 투쟁’의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정리한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투쟁은 아마도 서구 문명의 본질적 동력원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 알키메데스, 로크, 흄, 밀, 그리고 다윈으로 이어져온 이 기나 긴 계보는 조지 오웰과 처칠을 거쳐 ‘버밍험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마르틴 루트 킹)에 이른다. 이는 객관적 현실은 존재하는 것이고, 선의를 가진 인간들은 이를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실을 들이대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의 생각을 바꿀 것이라는 합의인 것이다.>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실사구시 정신이다. 사실과 현실에 기초하여 올바른 길을 찾으려는 실용정신이 결국은 개인의 존엄성과 문명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 점에서 동서양이 만나는 보편성을 발견하면서 사실과 현실을 떠난 관념의 유희가 20세기에 수억명의 인간 생명을 희생시켰던 점을 상기하게 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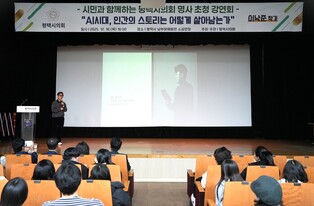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구민들이 뽑은 올해의 뉴스’ 발표](/news/data/20251218/p1160279250720596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올해 새빛 시리즈 정채 값진 결실](/news/data/20251217/p1160278686333473_93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216/p1160278005711962_38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英 런던 도시재생정책 벤치마킹](/news/data/20251215/p1160278249427463_893_h2.jpg)





